안동의 인물 - 잠암(潛庵) 김의정(金義貞)
공은 시조 고려판상사 풍산백(豊山伯: 문적文迪)의 10대손인 청백리 허백당(虛白堂: 김양진金楊震)의 맏자제로 한양 장의동에서 연산군 1(1495)년에 태어났으며 자는 공직(公直), 호는 유경당(幽敬堂), 잠암(潛庵) 휘(諱)는 의정(義貞)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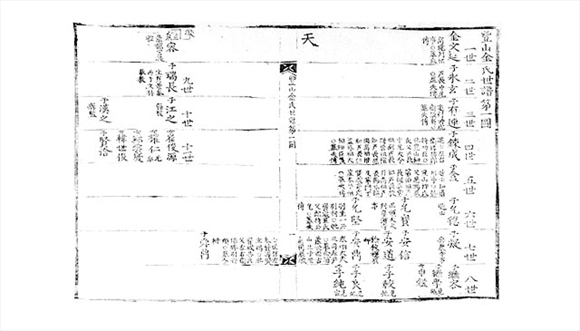 |
| >>풍산김씨세보(豊山金氏世譜)』, 풍산김씨보소에서 1793년에 편찬한 것이다. ⓒ유교넷 |
중종 11(1516)년에 진사, 중종 21(1526)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계해(1503)년 음력 11월, 9세때 모친(정부인 양천허씨)상을 당했는데, 어린 나이에도 예를 다하다보니 그만 병이 났다. 이 때 부친 허백당은 여러 가지로 공을 잘 보호양육 하였으나 그래도 기가 상당히 허약하였다. 이런데도 공은 때로는 침식을 잊고 글공부만 하니 아버지는, 과로에 어린 몸이 다칠세라 걱정이 되어 공부를 말렸으나 공은 역시 듣지 않았다. 그리하여 10여세에 경사와 백가에 두루 통하고 약관에 문장을 이루어 성균관에 유학하면서 이행(李荇) · 김정국(金正國) 등 학행 있는 선비들과 사귀었다.
대과에 오르던 그 해(1526년) 중종은 공에게 홍문관 정자를 제수하고 휴가까지 내려, 부친이 부윤으로 재임하는 경주에 근친토록 하였다. 공은 남쪽으로 내려갈 때 ‘춘풍사(春風辭)’를 지어 왕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의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문희연(聞喜宴)의 잔치가 파한지 며칠 후 왕명을 받아 홍문관으로 올라오는 길목 모량역(牟良驛)에 도착 했을 때도 시를 지었다.
東望幾回思白雲 (동쪽을 바라보고 부모님을 몇 번이나 생각했던가,)
南來猶自戀明君 (남쪽으로 내려오니 오히려 어진 임금 생각나네.)
情懷似涉漫漫水 (겹겹으로 싸인 회포 드넓은 물 건너는 듯하고,)
岐路東西摠不分 (기로에서 동서를 분간 할 수 없도다.)
곧 저작(著作) · 박사(博士)를 거쳐 수찬(修撰)에 오르고, 중종 25(1530)년 정언(正言) · 세자시강원사서(世子侍講院司書)를 겸임하였다. 이 때 세자(인종)는 세자궁에서 공부하였는데 학문이 날로 진보하였고, 공은 서연에서 세자를 보필하면서 늘 좋은 평을 받았다. 세자는 공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공에 대한 예우도 아주 잘하니, 소인들은 공의 명망이 조정에 성함을 시기하여 온갖 비방을 퍼뜨렸다.
 |
| >> 유경당종택 대문채 ⓒ유교넷 |
그 때 공의 재질을 아끼고 그 강직한 성품이 세상에 용납되기 어려울 것을 염려한 매부 이준경(李俊慶)은 공에게 당분간 조용히 쉬며 지내라고 당부하였다.
중종 32(1537)년 김안로가 사사되니, 2년 후인 1539년 공은 공조좌랑(工曹佐郞)에 기용된 후 곧 공조정랑(工曹正郞)을 거쳐 예조정랑겸춘추관기주관(禮曹正郞兼春秋館記注官)이 되었으며, 중종 36(1541)년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 1543년에는 다시 수찬을 거쳐 승문원교감(承文院校勘), 1544년 훈련원부정(訓練院副正), 인종 1(1545)년 종부시첨정(宗簿寺僉正)이 되었으나 7월 인종이 갑자기 승하하니, 공은 놀라움과 슬픔으로 병을 칭탁하여 귀향 후, 문을 닫고 교유도 끊고 바로 인종께 만사를 지어 애통한 회포를 남겼다. 고향의 자연을 벗 삼아 시문으로 소요자적 하면서 스스로 호를 유경당에서 잠암으로, 마을 이름을 오릉동에서 오묘동으로, 또 하나뿐인 자제에게, 벼슬을 하지 말고 농사나 지으라는 뜻으로 이름을 농(農)으로 고쳐 주었다.
공과 가까운 분들이 요로에 있어, 벼슬에 나아가 나라에 이바지하기를 모두 권했으나, 손을 저으며 말하기를 “천작(天爵)을 닦으며 인작(人爵)은 절로 오는 법”이라고 하기에, 공의 그 뜻을 모두 움직일 수 없음을 알고 다시는 권하는 이가 없었다.
 |
| >> 유경당 종택 ⓒ유교넷 |
계절식품은 먼저 사당에 드리기 전에는 입에 대지 않았으며, 공의 자형 김윤종(金胤宗)이 기묘사화로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나니, 그 유족을 데려다가 한결같이 돌보아 주었다.
또한 공은 소학을 아주 좋아하여 인격의 바탕은 거의 소학에서 구축된다고 하며, 누구에게나 소학 공부를 권했고, “공부 방법은 오직 효제(孝悌)뿐이니 요순의 도(道)도 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으며, 또 심경(心經) · 근사록(近思錄) 등을 항상 즐겨 읽었다.
중종 초에 조광조 등 신진 도학자들이 왕도정치를 실현코자 과감히 개혁을 서두를 무렵, 사람들이 공을 찾아와, “이제 옛 도덕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경하하고 기뻐했으나, 공은 “그렇게 갑자기 개혁을 하려다가는 도리어 행도를 그릇칠까 두렵다.”고 염려했는데, 과연 얼마 아니하여 도덕정치를 추진하던 신진 세력이 훈구파에 의해 무참히 꺾이게 되니, 이 기묘사화에 앞서 경하하던 사람들이 다시 공을 찾아와 이번엔 개혁정치를 비방하는지라, 공은 정색을 하고, “그것은 도덕에 잘못이 있음이 아니고, 실은 세도와 천운 때문이라 하겠는데, 오늘 도를 실현하려던 인재들이 모두 참혹한 화를 입은 마당에, 우리 도는 이제 설 땅이 없게 되어 못내 마음 아픈 노릇이다. 그대들은 다만 형세만을 쫓을 뿐이군.”하고, 각박한 세태를 개탄하니, 듣는 이들이 송연해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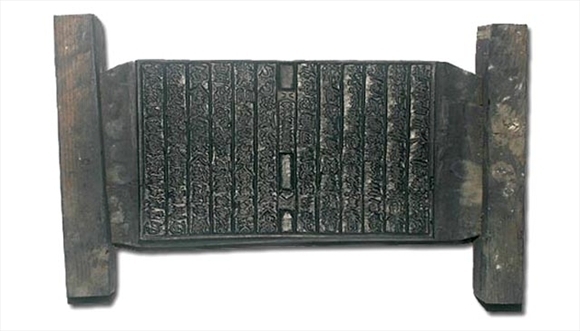 |
| >>『잠암문집(潛庵文集)』, 김의정(金義貞 ; 1495∼1548) 의 시문집으로 모두 5권 2책이다. ⓒ유교넷 |
공의 공부는 백가(百家)에 젖었으나 그 중에도 경학(經學)으로 깊이 익었다. 조광조(趙光祖) · 정사룡(鄭士龍) 같은 이는 공의 천형부(踐形賦) · 기강부(紀綱賦)를 보고, “사리(詞理)의 극치이며 독실한 생활 체험에서 이루어진 작품이다.”라고 극찬했으며, 이 두 작품은 우리 나라 역대대가의 작품 가운데서도 명문만 추려 엮은 “동문선속(東文選續)”에 함께 올라 있다. 을사(1545)년 인종의 승하 후에는 벗과 사귀기를 꺼렸으나, 오직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와 서로 도의로 사귄 경연청의 동료로서, 호남과 영남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죽기 전에 한 번 만날 수 없는 것을 한스럽게 여기고, 옛날 옥당(홍문관)에서 받은 운(韻)으로 다시 다음과 같이 화답하였다.
昔年曾厠玉堂臣 (옛적에 옥당의 신하로서,)
共許金蘭許國身 (함께 금란의 교분 맺고 나라에 몸 바쳤지.)
風雨無端中夜起 (한밤중 풍우가 무단히 일어나니,)
傷心存者兩三人 (슬픈소회 가진이 두 세 사람뿐이었네.)
라고 하였더니, 후에 하서가 공에게 다음과 같은 술회시를 보내왔다.
爲報花山金學士 [화산(안동)의 김학사에게 이르노니,]
向來環坐說何言 (지난번에 둘러 앉아 무슨 말을 하였던가.)
名吾軟熟空朝초 (나보고 유약하다고 조롱하고 꾸짖으며,)
自托昏冥巧避論 (스스로 혼명한 척 교묘히 남의 말 피했지.)
공이 남들과 접촉하지 않은지 오래되었을 때다. 하루는 이퇴계 선생이 찾아왔기에 일어나 접대를 했는데, 선생은 여러 가지를 비유해서 안심하라는 말로 위로한 다음, 요즈음 무슨 저술(著述)이 있느냐고 물음으로, 공은 수시(愁詩) 십수를 내보였더니, 선생은 몹시 안타까이 여기고 그 마음을 시로서 답하였다고 한다. 세상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다만 퇴계선생과 더불어 남모르는 소회를 가끔 풀기도 했으며,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한 사람이 공의 호인 잠암을 그림으로 그려 경모하는 마음을 붙여 보내왔다고 한다. 공은 역법에도 정통하여 사사로이 역서를 꾸몄는데, 서운관에서 만든 것과 견주어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고 한다.
 |
| >> 유경당 종택 사랑채 ⓒ유교넷 |
명종 2(1547)년 음력 10월에 서세하니 향년 53세이다. 인종에게 고충탁절(孤忠卓節)로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겸홍문관예문관대제학(吏曹判書兼弘文館藝文館大提學)에 증직되었고, 처음(철종 14 계해 1863) 시호는 정간(靖簡)공이었으나 고쳐진(고종2 을축 1865) 시호는 문정(文靖)공이다. 저서로 잠암일고(潛庵逸稿) 2권이 있다.
*본문에서 한문이 ?표로 나오는 것은 웹에서 기술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한자입니다. 이점 양해바
랍니다.-편집자 주)
* 김성규선생님은 <안동,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 흔적을 찾아서> 등 의 저자이며, 현재 안동공업고등학교에 한문선생님으로 재직중이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